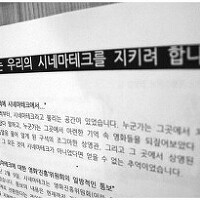우리 학년에서 유행했던 고급 영국식유머를 배우고 즐기기 위해 <몬티 파이튼의 성배>를 보았다. 그 이후 ‘몬티 파이튼’ 시리즈를 섭렵했고, 아이들의 농담에 같이 웃을 수 있었다. 문학시간에 조셉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에 관해 토론할 때 미리 준비하려고 <지옥의 묵시록>을 보았다. 영화 속에서 커츠 대령이 낭독했던 ‘텅 빈 인간들’을 마치 영미문학에 조예가 깊은 듯 수업시간에 읽어보았다. 미국문화사를 배울 때 <록키>를 보고 그 시대의 미국을 느껴보려 했다. 운이 좋아 맞게 된 학교 연극반 연출을 할 때 뮤지컬 ‘지붕위의 바이올린’을 했는데 그때 난 영화판 <지붕위의 바이올린>을 수백 번도 넘게 보았던 것 같다. 외국인으로서 대사를 줄줄 외우려면 그 수밖에 없었다.

단순히 서울 아트시네마의 작년 하반기와 올해 친구들 영화제 프로그램만 훑어도 나의 미국 고등학교 생존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며 이 글을 쓴다. 미국은 집이 크고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나뉘어져 있어 여가를 즐기려는 다수의 미국인들은 홈시어터 세팅을 집에 가지고 있다. 부모님, 조부모님 때부터 모아온 방대한 양의 VHS와 DVD들은 과거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그 집안만의 시네마테크, 시네마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고전영화들을 접했고 영화를 여가활동, 취미활동, 교양교육의 목적으로 보며 즐기는 사이에서 흑백영화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영미문화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시네마테크에서 주로 상영되는 고전영화와 예술영화는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영화적 메시지를 지녔다.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카라멜 팝콘을 먹으며 보는 영화와 달리 이 영화들은 옛 고전 문학을 읽는 듯한 영화적 소통의 느낌을 준다. 각 영화마다, 감독마다, 배우마다, 장면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다양한 감흥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부여된 의미 중 하나는 나의 미국 고등학교 시절 즐거웠던 서바이벌 학습법이다. 영화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여가의 수단을 뛰어 넘어 복합 문화 예술의 창조물로서 역사, 문화, 풍토, 감성, 정치, 철학 등을 담고 있다. 오늘도 나는 세상을 배우기 위해 영화를 보고 서울 아트시네마를 찾는다.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세이] 극장에서 로메르 영화를 본다는 것 (3) | 2011.02.27 |
|---|---|
| [에세이] 참 좋은 약국 '서울아트시네마' (0) | 2011.02.22 |
|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시네마테크 사태 (0) | 2010.05.09 |
| 견디고 버틸 것, 봄은 온다! (0) | 2010.05.05 |
| ‘시네마테크 사태’로 본 ‘시네필의 역할’에 관한 소고 (0) | 2010.04.29 |